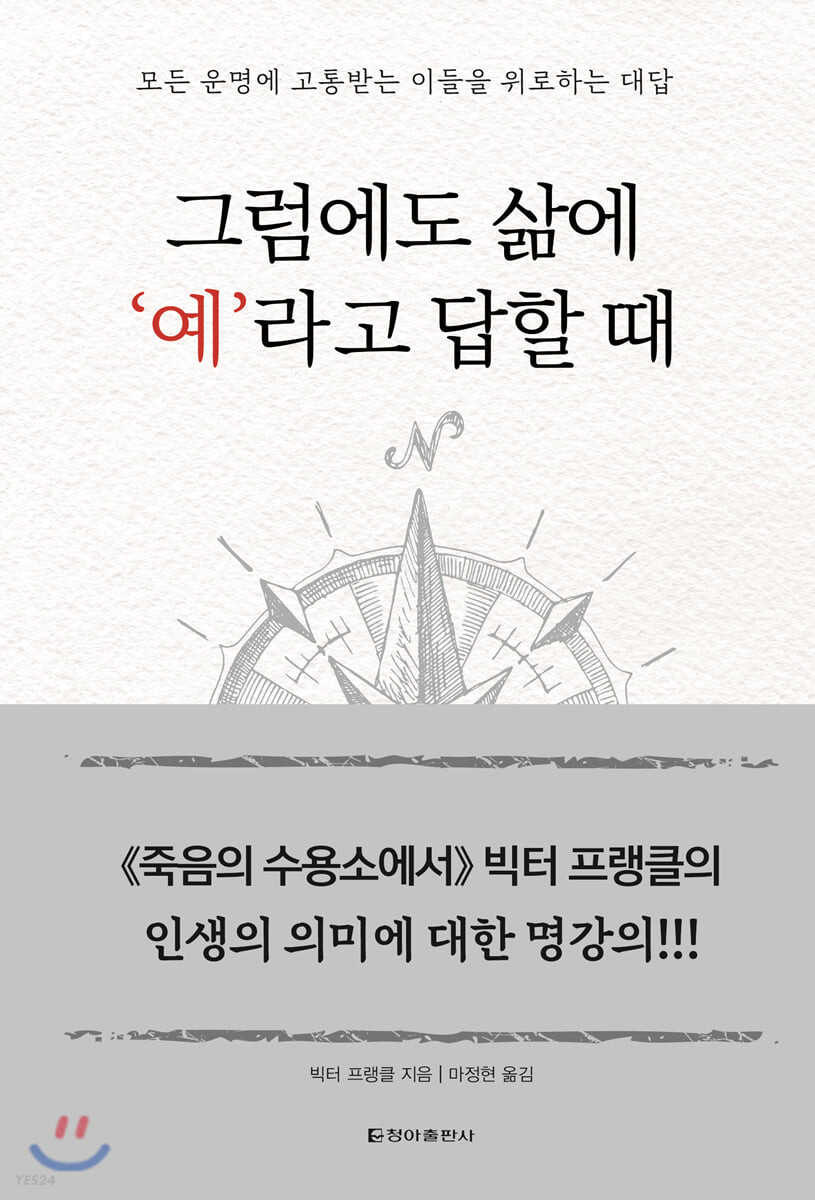
[내용]
우리는 수감자들이 언제 몰락하는지, 정신은 언제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버팀목을 잃어버렸을 때, 그에게 내적인 버팀목이 없어졌을 때라고 말입니다.
수용소 안에 있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종착역'이 없거나 알 수 없었고 그 끝이 언제가 될지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수용소 생활에서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였을 거라는 데 수감자들의 견해는 일치합니다.
또 끊임없이 떠도는 머잖아 전쟁이 끝난다는 소문은 기다림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짜는 계속 뒤로 미뤄지기만 했으니까요.
정신적인 버팀목을 잃어서, 특히 미래에 대한 버팀목을 상실해서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육체적인 쇠락으로도 이어집니다.
[감상]
빅터 프랭클이 1946년에 강연한 세 편의 원고를 실은 책이다. 그는 강제수용소에서 겪은 일들과 자신이 대화를 나누었던 상담자들의 사례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전하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고 그가 전쟁 기간 동안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꽤 놀라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하다.
개인적으로 유독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다.
한 사람은 직업이 재단사 조수였는데 저자와 함께 삶의 의미와 무의미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선생님은 상담소를 열고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죠. 하지만 전 그저 재단사 조수에 불과합니다. 제 행동이 어떻게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느냐 말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보다 어떻게 자신의 삶을 실현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잊고 있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저자는 "재단사 조수가 삶에 더 큰 책임감을 깨닫지 못한 상태로 살고 이를 저버리는 한, 그는 구체적인 환경에서 더 이상 행할 능력도 없고, 자신이 부러워하는 사람보다 더욱 의미 있고 의미를 충족시킨 삶을 영위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장에서의 업무가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저자는 강제 수용소에서 전쟁이 3월 30일에 끝날 것이라는 계시를 들었다며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3월 31일에 사망한 수감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본 '비관적 현실주의'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근거없는 희망과 낙관론이 육체의 쇠락으로 이어진 경우였다.
짧은 책이지만 결코 수월하게 읽히는 책이 아니었다. 세 번을 읽었어도 여전히 모호한 느낌이 남아있다.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내가 삶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삶이 내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리고 개인에 따라, 순간순간에 따라 그 질문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주변에 휘둘리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며 삶의 질문에 답하며 살라는 이야기인 듯 하다.
'독서 > 에세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 김수현 (0) | 2021.08.29 |
|---|---|
| 2인조: 우리는 누구나 날 때부터 2인조다 - 이석원 (0) | 2021.08.26 |
|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 - 김혜령 (0) | 2021.07.09 |
| 적당히 가까운 사이 - 댄싱스네일 (0) | 2021.06.27 |
| 내 옆에 있는 사람 - 이병률 (0) | 2021.06.23 |



